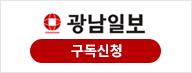|
| 송대웅 경제부 차장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가 보여준 현실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재 한국 가구의 주거 진입 난도를 압축한 상징 같은 숫자다.
조사 결과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은 7.7년에서 7.9년으로 늘었다. 2022년 7.4년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흐름은 금리, 물가, 전세시장 변동성이 서민 주거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시킨다.
자가보유율은 전체 64.4%로 높아졌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의 자가가구 PIR이 8.7배까지 오른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띈다. 전국 평균 PIR은 6.3배로 변함없지만 수도권만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거격차가 더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지역 PIR도 3.7배에서 4.0배로 상승해 결코 ‘안정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3.8%로 올라간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체 주거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미달가구 증가라는 ‘그늘’ 역시 함께 확인된 셈이다. 평균의 온도는 오르지만 취약계층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 ‘평균의 착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6%에서 38.2%로 줄어든 것은 단순히 ‘도움이 덜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반복된 시장 불안과 제한된 제도 효과 속에서 기대감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요구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었던 점은 주거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자가 거주자 평균 거주기간이 11.5년, 임차가구는 3.6년에 그친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다. 이동의 빈도는 곧 불안정성의 반영이기에 임차가구의 짧은 거주기간은 여전히 한국 주거시장의 구조적 숙제를 드러낸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숫자를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다.
7.9년이라는 시간, 수도권 PIR 8.7배라는 벽, 청년 임차비율 82.6%라는 현실은 ‘내 집 마련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주거정책은 시장의 뒤를 따라가서는 의미가 없다. 접근성의 격차가 주거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이번 조사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2025.11.19 (수) 19:36
2025.11.19 (수)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