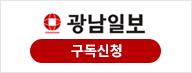|
| 고흥 소포봉수 전경 |
 |
| 고흥 소포봉수 전경 |
1991년 고흥군 구룡산 동쪽 정상부에서 발견된 ‘동산봉수터’가 조선시대 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던 ‘소포봉수’로 확인됐다. 이 봉수는 한양으로 신호를 보내는 용도가 아닌 지역 내 자체 감시체계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고흥군,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에 따르면 구룡산 소포봉수는 1531년 이후 고흥에 설치된 6개의 봉수 중 하나로, 폐지 연대는 1871년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봉수의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직경 6.48~8.82m, 높이 3.35m 규모다. 유물은 수마석(물결에 씻겨 닳아서 반들반들한 돌) 1점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동일면 덕흥리 산 286-1번지(조사 면적 1000㎡)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확인된 봉수로 기록돼 있지만 봉수의 운영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포봉수는 조선 중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기록된 봉수로, 중앙(한양)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는 주변 수군진과 연락이 힘들어 자체적 신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봉수의 신호와 관리는 사도진이 담당했다.
봉수는 고흥반도의 동남쪽 해안과 반도 내부로 들어가기 용이한 해창만 입구를 감시·관리하기 좋은 곳이며, 주변 대부분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로 주변 수군진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봉수를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경계하는 수단으로 축조된 소포봉수는 사화랑봉수, 묵지두봉수, 다고두봉수, 가화봉수, 가내포봉수와 함께 사도진에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고흥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 교류가 활발했지만 잦은 침입의 대상 지역이다.
특히 조선 초기부터 왜구가 배를 대는 곳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왜구가 자주 출몰해 여러 봉수가 만들어져 해안 방어에 철저히 대비했다.
현재 고흥에는 봉수 24개소가 확인됐다. 이들 봉수의 입지는 남쪽 해안선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앞서 1991년, 2002년 총 2차례 소포봉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1991년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이곳의 명칭을 구룡산에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 ‘동산봉수터’로 명명했다. 이후 2002년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이 문헌 기록과 주변 탐문조사를 통해 소포봉수임을 확인했으며, 분청사기편, 흑도편, 도기편 등이 확인됐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관계자는 “소포봉수는 동쪽의 녹도진, 발포진부터 서쪽의 사도진, 여도진까지 신호를 연결하는 봉수로 판단된다”며 “소포봉수의 정비·복원으로 역사 문화자원인 봉수의 의미와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09 (화) 08:24
2025.12.09 (화)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