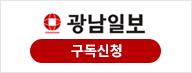|
#1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고물가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거두는 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을 뜻한다. 이는 소비자 대부분이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 차이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일종의 ‘꼼수’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15년 코카콜라와 펩시가 캔 크기를 줄여 교묘하게 간접적인 가격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빗대 처음 사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일간지에도 제과점 판매 빵이 같은 가격이지만 과거에 비해 무게가 줄었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기업들의 이런 마케팅은 오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질소과자’로 유명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제과업체가 과자 양은 줄이고 산화방지제로 포장지에 넣는 질소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우스갯소리가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급기야 2014년 9월에는 대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로 과자봉지 150여개를 엮은 뗏목을 만들어 타고 한강을 건너는 일도 벌어졌다고한다.
#2
현재 이런 현상은 식품업계는 물론 소비재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몰 등 주요 유통 업체에서 판매한 상품 중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오른 제품은 57가지였다.
이중 52종이 식품이었다고 한다.판매 만두 중량, 참치캔 용량. 젤리 함유량, 맥주 제품 용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흔한 일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기업이 순살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줄이고 원재료를 ‘닭다리살 100%’에서 가슴살 혼합으로 변경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러한 변경 사항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표기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샀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며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정도였다.
또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유료 멤버십 회원을 신규 모집하면서 연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축소해 논란이 됐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늘자 정부가 무게나 부피별로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 가격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어기면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호주 총리가 성명을 통해 “더 강력한 가격 표시제와 새로운 벌칙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은 호주인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라고 밝힐 정도다.
#3.
물론 기업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가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소비자 반발과 정부의 견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활용해 원가 부담을 완화해 온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수수료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은 더 커져 이의 활용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저항감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릴 때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정부가 이를 ‘기만적 인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떄문이다. 즉 겉으로는 가격을 동결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변경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식품·외식 기업들은 국민 삶과 밀접한 먹거리를 다루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집단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했다면, 사회적 책무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먹거리를 구입하는 것조차 고통을 호소하는 계층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김상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03 (토) 11:04
2026.01.03 (토)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