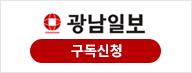|
 |
①지방은행의 역사와 현주소(프롤로그)
②은행권 이어 빅테크 기업까지 경쟁
③지방은행 설립 나선 충청권
④선진 사례-JB금융지주 ←
⑤전문가 제언
JB금융지주는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당시 자회사는 전북은행 1개가 전부였다. 다른 지방금융지주사와 비교하면 외연적으로 상당한 차이다. 2011년 출범한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4개, 3개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자산 규모도 격차가 컸다. JB금융의 2013년 3월 말 기준 자산총계는 16조1861억원이었다. 반면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출범연도인 2011년 말 자산총계가 각각 39조3587억원, 31조2940억원으로 자산 규모 자체가 타 금융지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JB금융은 출범 이후 덩치를 키우는 데 초첨을 맞췄다. 2013년 말 JB우리캐피탈 인수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4년에는 광주은행과 JB자산운용 등 자회사 2곳을 인수했다.
특히 광주은행 인수는 JB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큰 결정이었다. 당시 광주은행은 전북은행보다 큰 규모였다. 이 때문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유상증자도 실시해 광주은행 인수대금 5100억원을 마련했다. 광주은행 인수 후 다른 지방금융지주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자산 볼륨을 갖추게 됐다.
2014년 말 기준 JB금융의 자산 총계는 신탁부문을 포함해 총 38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6조원) 대비 135.2% 증가한 수치다. 당시 광주은행 자산은 총 19조4000억원으로 JB금융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후 2016년에는 전북은행이, 2020년에는 광주은행이 각각 프놈펜상업은행(PPCBank)과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사(현 JBSV)를 인수했다. JB우리캐피탈은 미얀마에서 JB Capital Myanmar를 확보했다.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영업전략도 세웠다. 지역 기반이 되는 호남지역의 기업 수가 적고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 일찍이 수도권 진출 확대 쪽으로 영업방향을 잡았다.
특히 소형 점포를 활용한 수도권 진출 전략을 구사했다. 또 공단보다는 주택 밀집지역에 점포를 내고 개인고객을 주타깃으로 공략하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2014년 4곳에 불과했던 광주은행 수도권 점포는 2015년 22개로 늘더니 2016년에는 30개로 급증했다. 3년 새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북은행 수도권 점포도 2012년 9개에서 2016년 19개로 증가했다.
이같은 차별화 전략은 성과로 이어졌다.
JB금융의 순이익은 2018년 말 3210억원, 2019년 말 3621억원, 2020년 말 390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권의 순이익 악화가 전망되던 시기였지만, JB금융은 지방금융의 열세를 딛고 순이익이 상승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말부터는 또 다른 지방금융인 DGB금융그룹 보다도 순이익이 앞섰다.
지난해에는 506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JB금융의 성과지표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지난해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전년 대비 2.70%p 오른 12.80%, 총자산수익률(ROA)는 0.19%p 높아진 0.96%를 나타내면서 3년 연속 동일 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순이자마진(NIM)도 2.98%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DGB금융과 BNK금융이 각각 1.96%, 1.91%이다. 대형 금융 그룹들은 1.8%대에 그친다.
건전성 지표도 좋다. 부실채권(NPL)비율은 0.54%다.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9%p 개선된 0.48%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성적도 역대급이다. JB금융은 올해 상반기 3200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실적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자회사별로는 전북은행이 전년동기 대비 22.0% 증가한 10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광주은행은 21.8% 증가한 1249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 자회사 JB우리캐피탈은 1.3% 증가한 184억원, JB자산운용은 150.9% 오른 6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주요 경영지표인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2%, 총자산수익률(ROA)은 1.14%로 집계됐다.
또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역대 최저치인 38.1%를 달성했다.
JB금융은 지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자회사들 사이 비슷한 사업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추진했다. 지난 2020년 4월 투자금융과 자산관리, 디지털전략 등 주요 분야에서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 협업과 시너지를 추진하는 ‘그룹시너지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다.
협의체는 각 사업 부문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회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너지협의체 3개 부문은 지주와 은행이 주축이 됐다. JB금융은 그룹 협의체를 통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계열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상품 설계와 영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갖췄다.
JB금융은 최근 글로벌 금융의 화두로 떠오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자체 배출량 2035년, 금융 배출량 204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여신, 투자 등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말 친환경 금융에 누적 1조8623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ESG 대출 잔액은 3조2142억원이다. 전체 기업, 가계대출 중 각각 9.2%, 9.7%를 차지한다. 지난해 ESG 채권 발행금액도 1조1200억원으로 지방금융 중 가장 높다.
JB금융은 전 계열사가 참여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역과 함께 탈석탄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광주은행은 작년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었다. 지역 저탄소 경제 전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북은행은 지난 2020년 전주시와 ‘탄소중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석탄금융 축소 환경을 함께 조성한다.
JB금융은 그룹 숙원사업이었던 내부등급법 도입을 성공하며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JB금융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은 데 따라 2분기 실적 집계분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본비율은 1%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JB금융 관계자는 “‘젊고 강한 강소그룹’이라는 그룹 비전아래 차별화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며 “내실위주 질적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19 (금) 21:37
2025.12.19 (금)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