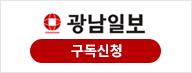|
|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29일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의 누에와 목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충남 아산군과 전남 보성군에서 열린 품평회 상장을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82·광주 북구)은 당시 충남 아산군과 전남 보성군에서 열린 품평회 상장을 공개했다.
이중 첫 번째 상장은 1921년 11월 26일 충남 아산군 각면 연합 물산품평회에서 ‘잠망(누에 채반)’ 부문 2등상(가로 42.5㎝, 세로 29.5㎝)이다.
수상자는 김기호이며, 심사위원장은 일본인 능봉장차, 품평회장은 당시 아산군수 신우선이었다.
이중 신우선(1873~1943)은 게이오대학 경제과를 졸업한 뒤 일본 대장성 근무를 거쳐 대한제국 탁지부 참서관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대표적인 친일 관료다. 당진·공주·아산군수도 역임했다.
또 다른 상장은 1922년 11월 6일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서 열린 제1회 농산물품평회 실면(목화 원솜) 부문 3등상(가로 39㎝, 세로 27㎝) 이다.
수상자는 임병철, 발행인은 보성군수 오석유였다.
이중 오석유(1882~?)는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제국 영변경찰서 경부로 근무하다가 한일강제병합 후 전남도 경무관, 보성·순천·여수·담양군수를 지냈다.
심정섭 명예관장은 “보성 품평회의 경우 품평회장과 수상자가 같은 일가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당시 심사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상장은 각각의 품목과 수상자 이름, 심사위원 명단, 주최 기관, 발행인의 직인 등이 선명히 찍혀 있다. 이는 조선의 농업 생산 체계가 일제의 행정망 아래 얼마나 세밀히 통제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다.
일제는 표면적으로 ‘농산물 장려’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누에와 목화의 안정적 수급이었다.
당시 일본은 화산 지형이 많아 누에농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주 원료 확보를 위해 조선의 잠업에 주목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는 일본 여성의 전통의상인 기모노의 주 원단이었고, 상류층 여성의 속옷감으로도 쓰여 수요가 폭증했다. 조선총독부 영부인이 직접 충남 아산의 잠농가를 찾아 격려할 정도로 잠업은 일본 정부의 ‘특별관리 품목’이었다.
특히 일제는 13도 단위로 5년마다, 면 단위로는 5~10년에 한 번씩 품평회를 개최하며 농민을 경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상장과 함께 일본 신원보증서(도황증)나 노역 면제, 상급학교 진학 혜택 등을 미끼로 농민을 회유했다.
목화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 농민이 재배한 목화는 일본군 군복의 원료로 사용됐다. 심 명예관장은 “당시 일본 순사들이 면화밭을 돌며 생산량을 감시하고,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덜 여문 목화 열매(다래)를 따먹는 것도 단속했다”고 증언했다. 일제가 ‘농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식민지 농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이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노골화됐다. 1910년 한일병합 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토를 강제로 몰수하고, ‘회사령’을 통해 일본 자본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리고 지방 단위로 품평회를 조직해 농민에게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착취를 제도화했다.
이처럼 일제는 겉으로는 근대적 농업 발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력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통제 장치였다.
농민들의 피땀으로 생산된 명주와 솜은 일본의 기모노와 군복으로 변해 갔고, 조선의 농촌은 점점 더 빈곤해졌다.
심 명예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상장은 단순한 상장 두 장이 아니라, 조선 농민의 삶이 어떻게 일본 제국의 산업 밑천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며 “경제적 식민지화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0.29 (수) 20:40
2025.10.29 (수)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