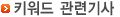|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완 지부장. |
디카시는 1990년대 필름 카메라가 퇴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등장, 필름 대신 내장된 메모리카드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길이 열리면서 필름을 인화하고 현상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이미지를 불러와 재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디카시 생성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압도하고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이미지를 저장하기도, 지울 수도 있어 이미지의 활용이 수월해졌다.
시와 사진의 만남인데 오늘날 버전이 열린 셈이다. 시와 사진의 만남은 디지털 시대 전에는 분업화가 돼 있었다. 시 따로, 사진 따로였다.
이것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장르가 디카시다. 디카시는 대략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0여년 전후로는 디카시만을 위한 문예지 등이 발간되면서 발표창구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문학 장르에서 가장 후발 장르로 첨단문명이 뒷받침돼 가능하게 된 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직 정통 장르의 위상이나 체제만큼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전국 조직망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도 디카시를 추구하는 시인들을 주축으로 모임체가 결성돼 주목된다. 지난 19일 오후 (사)광주평화포럼 사무실에서는 백수인 시인(전 조선대 교수)과 김규성 시인(담양 글을낳는집 대표), 함진원 시인, 한영희 시인, 김황흠 시인, 송기역 시인(광주 기역책방 대표) 등 기존 시인과 수필가 및 동화구연가 등으로 활동을 해온 차꽃(곽성숙)시인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가 창립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
| 인준서를 전달한 김종회 회장과 김완 지부장(왼쪽). |
 |
| 한국디카시인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사)광주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광주지부를 본격 출범시켰다. 사진은 출범식에 참여한 회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
한국디카시인협회 수장을 맡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종회 회장(문학평론가)과 이날 창립식 사회를 맡은 이기영 사무총장, 한국 최초 디카시집 ‘고성 가도’ 등을 펴내 디카시 보급에 힘써온 이상옥 소장(한국디카시연구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적으로 디카시 대중화에 온힘을 쏟고 있는 최광임 계간 ‘시와 경계’ 발행인(두원공대·경남정보대 겸임교수), 염혜원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초대 지부장에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의사 시인으로 활동 중인 김완 원장(혈심내과)이 맡았다. 사무국장은 김령(김혜영) 시인이 맡기로 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정관 확정, 지부장 위촉장 전달 및 깃발 전달, 김종회 회장 축사, 신임회장 인사말, 회원 소개, 떡 케이크 절단, 기념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백수인 전 교수는 “디카시를 보면서 예술장르가 이렇게 분화 발전하기도 하고, 융합하는 것 같다. 이제 디카시를 보면 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디카시가 짧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함축적이고 직관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디카시인협회 이기영 사무총장은 백 전 교수의 말에 이어 “세계적으로 한국 디카시가 확산돼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더욱더 확산되리라 믿는다. 광주지부가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 왼쪽부터 최광임 부회장, 백수인 전 조선대 교수, 김완 지부장, 김종회 회장, 이상옥 소장. |
 |
| 축사를 하고 있는 백수인 전 조선대 교수. |
향후 광주문화재단 등 지원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신청, 유치하고 디카시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원 디카시집 발간과 디카시 걸개시화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완 지부장은 지부 운영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지부장을 맡게 돼 조직을 뿌리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어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직은 처음이라서 서툴고 미미하다. 그러나 디카시가 K-컬처의 선두에 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작은 힘이지만 대중들과 시인들 사이에서 광주디카시가 잘 정착이 되도록 힘을 보탤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의 출범에 따라 초보 단계나 마찬가지인 지역 디카시단이 활성화와 대중화 등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고선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04.22 (화) 03:20
2025.04.22 (화)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