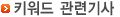|
| ‘미래 기억_과거는 왜 지나가지 않는가’(2025) |
송 작가의 예술세계의 핵심에는 ‘물’이라는 매개가 자리한다. 작가는 흐르는 물을 통해 기억을 지우고 감정을 잇는 행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비물질적 언어로서의 예술을 실험하고 있다. 관객이 한지 위에 물로 지우고 싶은 기억을 쓰고, 그것을 허공에 걸어두는 관객 참여 프로젝트 ‘물로 쓴 시(詩)’는 물이 증발하면서 종이의 구김이 감정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예술이 곧 사유와 치유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오하나 인피니티-소환된 미래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더 이상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질문을 품고 삶과 대면하는 하나의 통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간의 사유와 조형적 실험이 5·18의 역사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예술적 결실이라는 설명이다.
전시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4개 전시공간에 과거(아트폴리곤), 현재(연결로), 미래(글라스폴리곤)의 순환 구조로 구성돼 있다. 마치 전시의 제목 ‘인피니티’를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사작과 끝이 연결된 구조이다. 1전시관 ‘미래기억’의 입구에 들어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기찻길을 마주하게 된다. 이어 2전시관 ‘가까이 먼’에서는 이라크 아브 그라이브 수감자들의 인간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한 드로잉 작품을 만나게 된다. 이 인간피라미드 이미지는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에게 가한 잔혹한 고문과 학대 행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사유의 장을 제시한다.
또 과거 섹션의 욕망과 비극의 탑 설치작품 ‘심음, 과거는 왜 지나가지 않는가’의 영상 속에는 전설의 러시아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노스탤지아’(Nostalghia, 1983)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이탈리아의 산 갈가노 수도원이 등장한다. 송 작가 또한 이 공간의 구조를 빌어 황폐화돼 가는 인간 존재의 내면을 표현했다.
현재의 연결로를 지나 미래를 상징하는 3전시관인 베이스폴리곤 지하 1층 ‘물로 쓴 시(時)’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회화와 영상, 설치작품으로 표현한 ‘천개의 눈물’ 시리즈가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심연의 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공간에서 깊은 슬픔과 상처의 공감을 체험하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글라스폴리곤 1층에 마련된 관객 참여형 섹션 ‘물로 쓴 시(詩)’로 마무리된다.
이 공간은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침묵의 방으로, 관람객은 이곳에서 자신이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물붓을 이용해 한지에 써 내려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글자는 증발하지만, 감정은 공간 속에 고요히 남아 관객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한다.
 |
| ‘가까이 먼_구름 먼지’(2008) |
송창애 작가는 미국 오리건대(University of Oregon)에서 회화 및 드로잉을 전공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 기억과 상처,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를 예술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석사과정 중 9·11 테러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고문 사진을 접하며, 그는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대한 내면적 충격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제작한 ‘발가벗은 인간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한 매스 랜드스케이프(Mæss Landscape) 연작은 인간의 존엄성과 비극이 교차하는 시공간적 층위를 형상화한 대표적 초기작이다.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서구 중심의 소실점적 시각을 해체하고 다중 시점을 통한 ‘이동하는 시선’의 공간을 구축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맞닥뜨리며 작가는 ‘천개의 눈물’ 시리즈를 완성하기도 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고선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05.30 (금) 05:57
2025.05.30 (금) 05:57